여름에 읽는 고전 :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오랜만에 민음사 고전을 읽었다. 얇은 두께의 책이어서 거부감 없이 시작했다.
다수의 고전이 그러하듯 감탄사와 길어지는 묘사가 끊임없어 힘든 구간도 있었으나, 여름을 물씬 느끼며 사유할 수 있었다.
(스포주의~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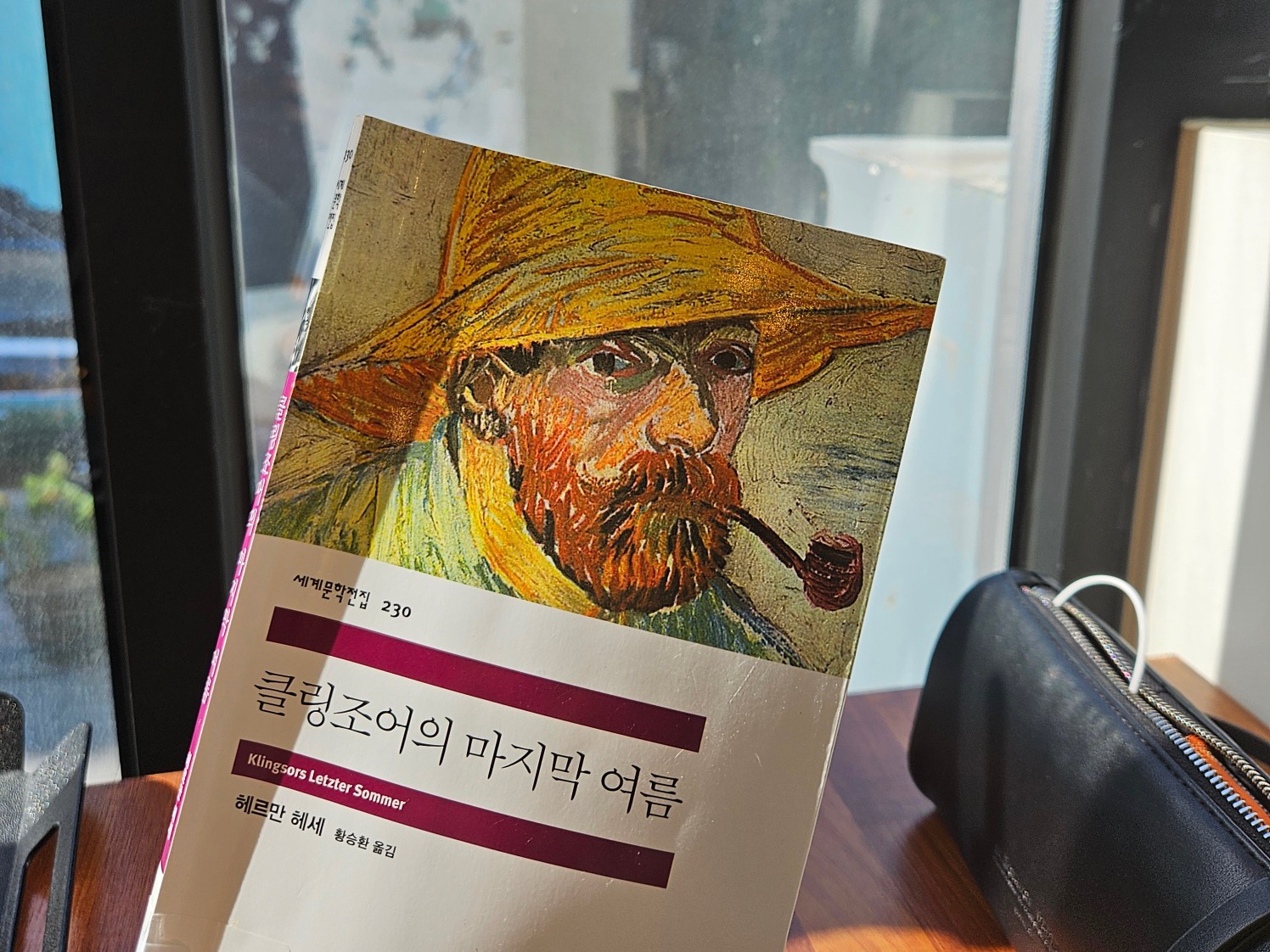
표지에서부터 고흐의 채색이 느껴지듯, ‘클링조어‘는 화가이다.
7월, 그는 좋아했던 지방들을 여행하며 지인들과 함께 풍경을 감탄하고, 술을 마시고 그림을 그린다.
햇볕에 스치는 잎들, 색색의 탐스러운 과실들, 길을 따라 나오는 집과 여인과 어린아이들…
물감이 갖는 색의 제한성으로 경치를 보며 느낀 감탄들을 담기 위해 그는 고군분투한다.
때문에 클링조어의 눈이 바라보는 풍경은 조화롭게, 화폭에 담기는 색채는 다소 강렬하게 묘사되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어색함 없이 동일한 장면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현되도록 한다.
그는 술을 사랑하고, 여자를 좋아하며, 친구 ’루이스‘를 언제나 그리워한다.
그리고 당 시대 애주가였던 시인 이태백과 그의 친구 두보를 흠모한다.
서양 소설을 읽는데 자꾸 이태백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중간중간 흠칫했다. (찐으로 이태백 덕후다)
루이스와 함께한 일화들은 짧으나 클링조어는 그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상태, 체념, 이상, 공허함 등을 표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는 큰 짐을 꾸려 여행을 떠나고 늘 이해와 동정을 바라왔던 자신의 태도가 결국 관계에 있어 부담과 침묵을 안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여름 내내 풍경을 감상하고 방 안에서 잠 못 들며 스케치를 고를 때도 그는 곁에 없는 친구를 떠올린다.
(술에 취하면 그는 불현듯 이태백과 두보를 상상 속 술친구로 소환하는데 쌍벽을 이루는 시인이자 막역한 친구였다는 점,
특이한 색채를 쓰는 고흐나 고갱의 관계 등이 화가인 두 친구 클링조어와 루이스에게도 꽤나 연결된다.)
또 한 사람, 그의 안에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는 ’지나‘다.
지나는 책에서 내내 클링조어의 회상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클링조어는 여행 동안 만나는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고, 욕망을 갖고, 호기심을 느끼는데 자세히 묘사되진 않더라도
이 여러 개의 스치우는 사랑들 중에서 결국 귀결되는 곳은 지나라고 느낀다.
그는 자신을 사랑한 여인의 고백 편지에 답신하면서도 내가 당신만을, 그리고 지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쓰고 있다.
사람은 여러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모두 동일한 깊이일 수 없기에 대한 변명과 미안함도 섞였으리라 생각했다.
클링조어가 일생을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사랑이란 감정을 회고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은 결국 지나였으나, 현실에서 그의 곁에 함께한 사람이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얕은 사랑이 쉬이 여러 개로 뻗었을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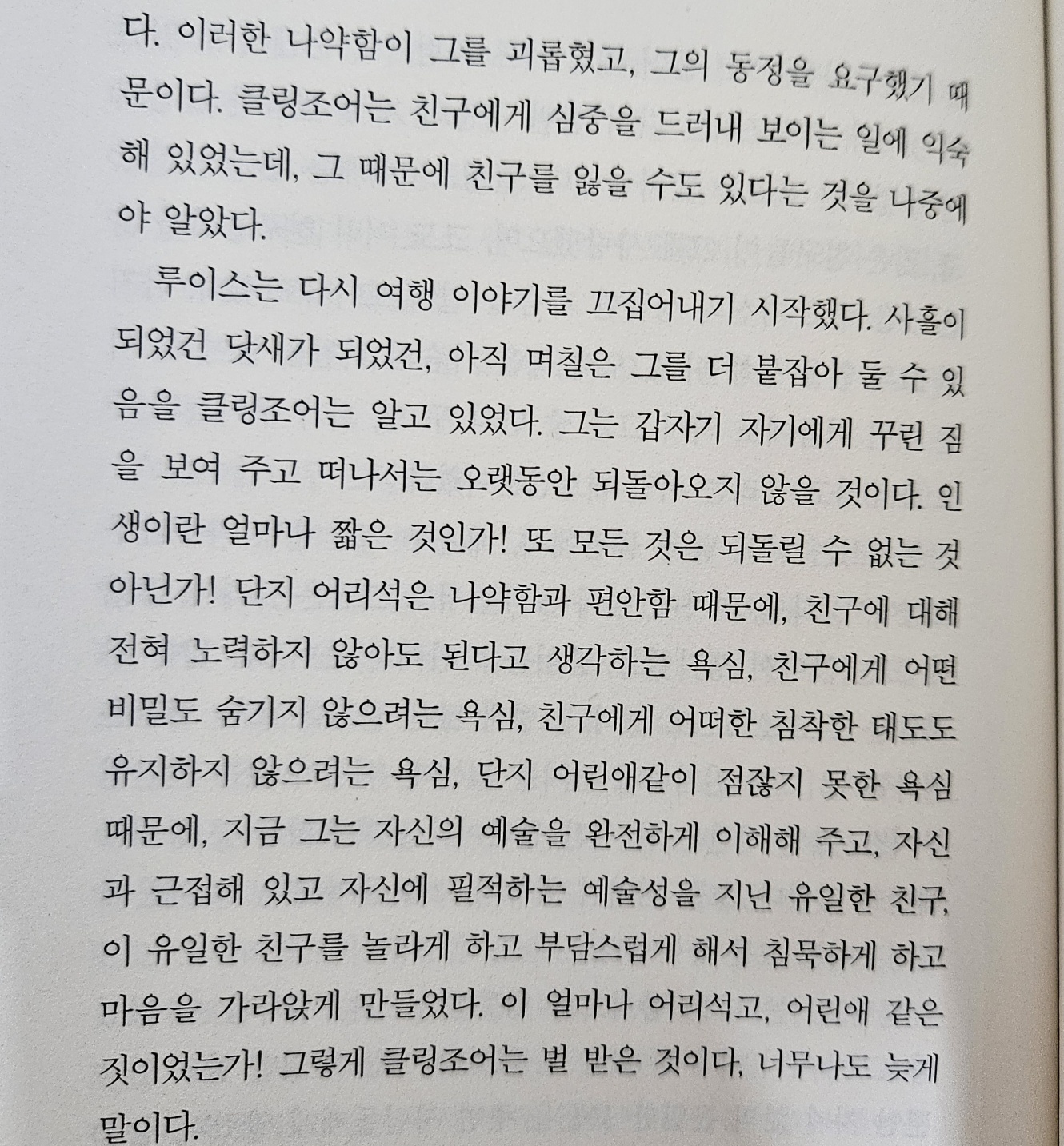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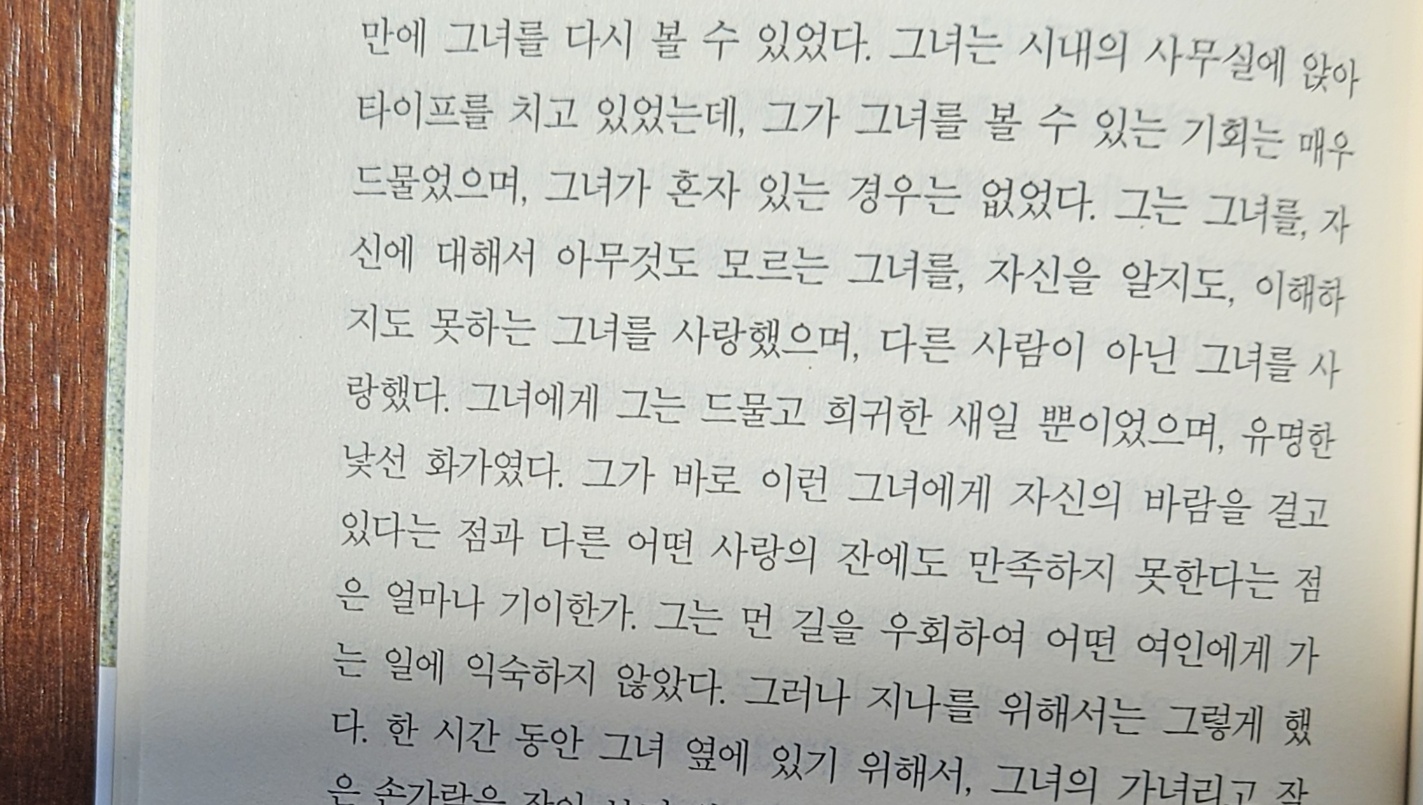
눈의 통증, 쇠약한 마음 상태, 술에 이끌려야만 잠이 들 수 있는 나날들,
그는 죽음이 암시되는 마지막 여름 내내 그림을 그리며 화가로서 충실했다.
때로는 생생한 육체와 열망이 들끓던 젊은 어떤 시간들을 동경하다가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우수에 젖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백의 시구에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또한 이 몰락의 과정이 새로움을 탄생시키기 위함임을 강조하면서도
늙어가는 육체를 직면하고 붙잡을 수 없이 일방적인 흐름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느끼며 한계성이 갖는 두려움 역시 보여준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클링조어가 가장 사랑하는 7월.
그는 눈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현재 곁에 없는 보고 싶은 이들을 마음껏 추억한다.
여름이 저물어가자 그는 그간 그려왔던 풍경보다는 상상, 그리고 자화상들을 그리며 작품에 몰두한다.
마지막 순간 죽음이 맞이했다는 마무리가 아닌, 지나에게로 향하고 싶음을 나타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짧은 여름동안의 일들만이 묘사되었지만 삶의 태도, 주위의 사람들, 한 인간으로서 갖는 시간의 한계와 그럼에도 무구하게 흘러갈 영속성들이 느껴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의 낡은 것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양식이 태어나며 발전해가고 있다. 몰락한 것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쌓여간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수많은 갈등의 역사 위에 태어난 우리들은 또 앞으로 어떤 세대를 잉태하기 위해 현명하게 몰락해 갈 것인가, 생각해 볼 때이다.